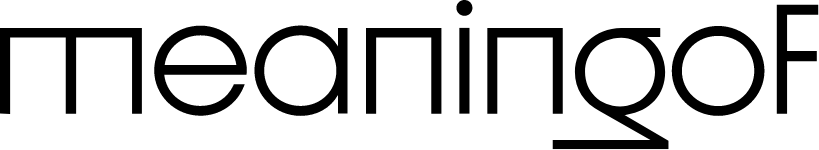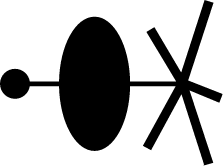<시놉시스>
경주의 한 시골 마을, 차 하나 들어가기에도 좁은 시골길 끝엔 ‘읍천댁’ 할머니의 집이 있다.
작은 부엌 방에서 홀로 하루를 다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읍천댁의 하루는 누구보다 시끌벅적하다.
매 끼니마다 밥 달라고 야옹거리는 고양이 ‘쫑이’부터
하루에도 두세 번씩 좁을 길을 따라 읍천댁을 보러 오는 ‘전안댁’ 할머니까지.
날마다 투닥거리고 욕하고 아옹다옹하지만,
밭일을 하고 간식을 먹는 읍천댁의 곁엔 항상 전안댁과 쫑이가 있다.
2022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비경쟁 부문
2022 서울여성독립영화제 경쟁 부문
<프로그램 노트>
시작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고양이 울음 소리에서부터였다.
할머니네로 매일 밥을 먹으러 온다는 고양이 ‘쫑이’의 울음 소리.
쫑이의 근황을 물으며 시작했던 대화는 할머니의 하루 생활, 요즘 관심거리, 근심거리로 끝이 났다.
어째서 나는 고양이에 대해 물었는데 할머니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
할머니네로 향하는 쫑이의 발걸음을 세다 보니 할머니를 찾아오는 전안댁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혼자 힘으로는 걷기도 힘들다던 전안댁 할머니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할머니네로 찾아와 탱탱볼처럼 탱글한 욕을 먹는다.
한 달에 한 번씩 막내딸이 보내주는 사료로 온 동네 고양이의 아침, 저녁을 챙겨주는 전안댁 할머니.
그리고 쫑이 말고는 다른 고양이가 밥그릇에 손도 못 대게 하는 읍천댁 할머니.
너무 다른 성격의 두 할머니는 육십 년 넘게 상계리 마을에서 서로의 동갑내기 친구로 지냈다.
나를 불러주고, 매일 같이 곁에 와 자신을 지켜주는 쫑이를 친구라고 말하는 읍천댁 할머니.
그런 쫑이를 대하는 읍천댁 할머니의 마음은 똑같이 전안댁 할머니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육십 년째 서로를 찾아오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곁을 지켜주는 우정은 어떤 것일까?
작은 수박 조각을 더 작게 나누어 먹는 것, 친구의 밭에 함께 씨를 뿌려주는 것.
아옹다옹 다투고도 내일이면 또다시 나를 찾아와줄 것을 아는 것.
부럽도록 따뜻한 읍천댁과 전안댁, 그리고 쫑이의 우정은 오늘도 상계리 마을에서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